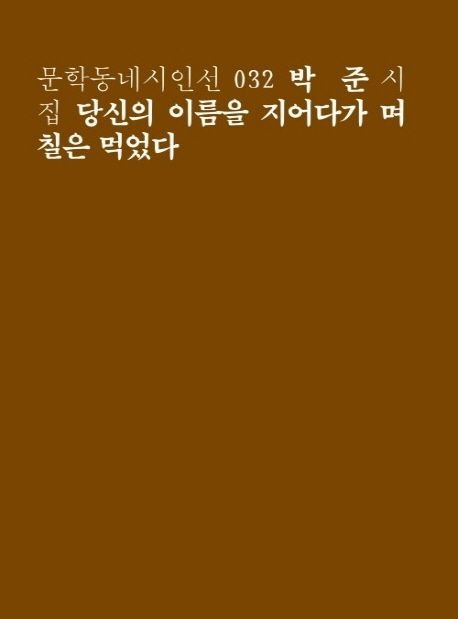
| 분류 | 내용 |
|---|---|
| 제목 |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 |
| 저자 | 박준 |
| 출판 | 문학동네 |
| 장르 | 시집 |
| 읽은 기간 | 2025-02-07 ~ 02-08 (2일) |
| 별점 | ⭐⭐⭐⭐ |
☰ 내용 목차
※ 목차를 클릭하면 해당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 읽으면서 느꼈던 감정들
시집을 읽는다는 것은 다른 류의 책을 펼쳐 읽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 이야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문장을 하나씩 주워 담는 느낌에 가깝다. 어떤 문장은 손안에 오래 쥐고 있다가 다시 내려놓게 되고, 어떤 문장은 미처 다 채기도 전에 흩어져버린다. 박준의 시는 특히 그랬다. 마치 익숙한 감정 앞에서,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를 다시 듣는 것처럼 문장을 따라가게 된다.
토요일 오후였다. 빛이 바닥에 길게 누워 있었다. 창을 열면 공기가 한 겹 밀려들고, 책장을 넘길 때마다 먼지가 가볍게 날아올랐다. 그런 시간 속에서 시를 읽었다. 문장 하나가 손끝에 닿고, 또 하나가 지나가고, 그다음 문장에서 멈춰 섰다. 치매 노인에 관한 시였다. 누군가는 기억을 떠올릴 때만 온전해지고, 누군가는 기억이 흐려져야 비로소 살아갈 수 있었다. 기억은 사람을 붙잡고, 기억하는 일은 때때로 버거운 짐이 되었다. 책을 덮고 한동안 눈을 감았다. 얼굴 하나가 떠올랐다 사라졌다. 기억과 망각의 경계가 흐릿해져버린 그 사람.
어떤 문장은 너무 단순해서 오래 남는다. 나는 그 장면을 오래 바라보았다. 아무 일도 없는 듯 이어지는 저녁 식사, 하지만 그 안에 피어나지 못한 한 생명의 부재가 뚜렷한 순간. 그 아쉬운 별빛이 사라지고도 삶은 계속된다는 사실이 새삼 낯설게 다가왔다. 그게 가장 견디기 어려운 일인지도 몰랐다. 살아남은 사람은 결국 내일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
책을 덮고도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시는 몸에 남는다. 한 문장이 지나간 자리에는 흔적이 생기고, 바람이 불던 곳에는 무언가가 흔들린다. 언젠가 이 책을 다시 펼칠 때, 그때도 오늘처럼 한 문장에서 멈춰 서게 될지, 그땐 어떤 마음으로 이 문장들을 읽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책장을 넘기던 손끝의 감촉만큼은 오래 남을 것 같았다.
📜 기억에 남는 글귀 (스포주의)
⚠️ 주의 : 이 아래로는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으니, 아직 책을 읽지 않으셨다면 아래는 나중에 확인하세요!
미신
...(생략)...
두 다리를 뻗어
발과 발을 맞대본 사이는
서로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는 말을
어린 애인에게 들었다.
...(후략)...
동지
...(생략)...
라면 국물의 간이 비슷하게 맞는다는 것은 서로 핏속의 염분이 비슷하다는 뜻이야
...(후략)...
꾀병
...(생략)...
한 며칠 괜찮다가 꼭 삼 일씩 앓는 것은 내가 이번 생의 장례를 미리 지내는 일이라 생각했다. 어렵게 잠이 들면 꿈의 길섶마다 열꽃이 피었다. 나는 자면서도 누가 보고싶은 듯이 눈가를 자주 비볐다.
힘껏 땀을 흘리고 깨어나면 외출에서 돌아온 미인이 옆에 잠들어 있었다. 새벽 즈음 나의 유언을 받아적기라도 한듯 피곤에 반쯤 묻힌 미인의 얼굴에는, 언제나 햇빛이 먼저 와 들고 나는 그 볕을 만지는 게 그렇게 좋았다.
광장
사람이 새와 함께 사는 법은 새장에 새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마당에 풀과 나무를 키우는 일이었다- 정도의 글귀를 생각해 너의 무릎에 밀어넣어두고 잠드는 날도 많았다.
...(중략)...
지난 꿈 얘기를 하던 어느 아침에는 옥상에 널어놓은 흰 빨래들이 밤새 별빛을 먹어 노랗게 말랐다.
⸙ 이 시의 이 밑줄 친 글귀가 특히 좋았다. 나의 마당에 풀과 나무를 넉넉히 심어 놓고 모이통에 좋은 먹이를 낙낙하게 넣어놓으면 편히 와서 쉬어주겠지, 오래 있어주겠지 싶어서.
미인처럼 잠드는 봄날
믿을 수 있는 나무는 마루가 될 수 있다고 간호조무사 총정리 문제집을 베고 누운 미인이 말했다. 마루는 걷고 싶은 결을 가졌고 나는 두세 시간 푹 끓은 백숙 자세로 엎드려 미인을 생각하느라 무릎이 아팠다.
기억하는 일
구청에서 직원이 나와 치매 노인의 정도를 확인해 간병인도 파견하고 지원도 한다. 치매를 앓는 명자네 할머니는 매번 직원이 나오기만 하면 정신이 돌아온다.
…(중략)…
오래전 사복을 입고 온 군인들에게 속아 남편의 숨은 거처를 알려주었다가 혼자가 된 그녀였다.
⸙ 기억을 잃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속죄를 위해 다시 제정신을 끌고 오는 그 순간이.
낙 (落)
...(생략)...
다음날 아침
밥상에 살이 댕댕하게 오른
그러니까 동생 같은
⸙ 마지막에 저게 무슨 뜻인가 했는데, 제목 보고 아. 다시 한번 심장이 내려 앉았다.
별들의 이주
…(생략)
새로 울고 싶은
오월의 밤하늘에는
날아오른 새들이
들깨씨를 토해놓은 듯
별들도 한창이었습니다
낙서
저도 끝이고 겨울도 끝이다 싶어
무작정 남해로 간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는 벌써 봄이 와서
농어도 숭어도 꽃개도 제철이었습니다
…(중략)…
봄날에는
’사람의 눈빛이 제철’이라고
조그맣게 적어놓았습니다.
저녁
…(생략)…
당신의 슬픈 얼굴을 어디에 둘지 몰라
눈빛이 주저앉은 길 위에는
물도 하릴없이 괴어들고
소리 없이 죽을 수는 있어도
소리 없이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다가
문득 우리가 만난 고요를 두려워한다
문병
…(생략)…
아무것에도
익숙해지지 않아야
울지 않을 수 있다
해서 수면(水面)은
새의 발자국을
기억하지 않는다
…(중략)…
미열을 앓는
당신의 머리맡에는
금방 앉았다 간다 하던 사람이
사나흘씩 머물다 가기도 했다
미인의 발
…(생략)…
낙타는 불이 다 꺼진 뒤에야 미용실에서 나와 삼거리 지나 일방통행로로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낙타가 사하라로 갔는지 고비로 혹은 시리아 사막으로 갔는지 알 수 없지만요.
…(후략)…
⸙ 죽음은 사막으로 가는 발인가보다.
유성고시원 화재기
…(생략)…
누전이나 방화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단지 그동안 울먹울먹했던 것들이 캄캄하게 울어버린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오늘의 식단
…(생략)…
사람의 울음을
슬프게 하는 것은
통곡이 아니라
곡과 곡 사이
급하게 들이마시며 내는
숨의 소리였다






댓글 남기기
닉네임, 댓글 하나라도 작성 안하면 등록 버튼이 비활성화 됩니다. 원래 경고창이 떠야했는데 제 지식이 부족해서 구현이 안돼요ㅠㅠ 안내문구 남겨드립니다.